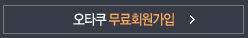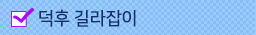[정치/사회] 가족은 편하게 지내야 할 거 아니냐 … 특감반이 협박했다
상세 내용
 작성일 : 17-03-28 13:01
작성일 : 17-03-28 13:01  조회수 : 1,227
조회수 : 1,227  추천수 : 0
추천수 : 0
 작성일 : 17-03-28 13:01
작성일 : 17-03-28 13:01  조회수 : 1,227
조회수 : 1,227  추천수 : 0
추천수 : 0
본문
표적감찰 거부하다 좌천된 전 문체부 감사관 2명 인터뷰
“너무 억울해 ‘자살이라도 할까’ 하고 두 번쯤 생각했습니다. 우병우와 특별감찰반은 내 주장이 먹히지 않는 절대권력이었으니까요. 내가 죽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”
백모(57)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‘우병우’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다. 아직도 상처가 깊은 듯했다.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그를 만났다.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성사된 자리였다.
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그는 “서모 사무관 등 2명을 징계하라”는 우병우(50)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(이하 특감반)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지난해 2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된 뒤 지난 2월 감봉 등 추가 징계를 받았다. 1990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“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려 지난 27년간 ‘공정’과 ‘투명’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”고 말했다.
그가 좌천된 표면적 이유는 “민원인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”이라는 민정수석실의 지적 때문이었다. 하지만 그는 “문화계 30년 멘토와 휴일에 골프를 친 것과 한 공연업체가 관행적으로 홍보를 위해 보낸 무료 초대권이 발견된 게 문제의 전부”라고 주장했다. 지난 2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.
2015년 11월 처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에 불려 간 백 전 감사담당관은 특감반 이모 과장에게 “국민소통실 소속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무조건 징계하라. 윗분의 지시다”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. 백 전 감사담당관은 “자체 감찰 TF팀을 꾸려 조사했지만 징계 사유를 찾을 수 없었고 그대로 보고한 게 화근이 됐다”고 설명했다. 지난해 1월 특감반은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. 백 전 감사담당관은 “영장도 없이 저와 사무관, 주무관의 휴대전화·컴퓨터·서랍·e메일을 4시간 이상 뒤졌다”고 말했다. 3일 뒤 특감반에 불려 간 그는 “지시에 따라 신발과 양말을 벗었고 이후 신체 수색을 당했다. 휴대전화도 빼앗긴 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라고 강요받았다. 지갑에서 국가유공자증이 나오자 ‘사기 쳐 받은 것 아니냐. 털어 보겠다’는 협박도 받았다”고 했다. 82년 군 복무 시절 지뢰를 밟고 파편에 다쳐 받은 유공자증이었다.
백 전 감사담당관이 좌천된 이후에도 특감반의 감찰 요구는 후임자인 김모(58) 전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계속됐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모두 다섯 번에 걸쳐 특감반 사무실에 불려 갔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“호통을 치는 건 기본이고 ‘가족들은 편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니냐’ ‘통장을 다 뒤지겠다’며 가족들을 뒷조사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. 나에겐 협박으로 다가왔다”고 말했다. 휴대전화를 빼앗은 특감반원에게서는 “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한 거야” “무슨 얘기를 했어” 등의 추궁이 이어졌다고 한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“업무랑 무관한 것들도 다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.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”고 덧붙였다.
지난달 특검팀이 작성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서에는 김 전 감사담당관이 “서 사무관에게는 징계 사유가 없다”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특감반에 전달하자 특감반이 수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며 “무조건 중징계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”고 압박한 정황이 담겨 있다.
둘 다 좌천된 뒤 표적감찰 대상자 결국 징계
김 전 감사담당관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‘셀프 좌천’뿐이었다고 한다. 그는 “민정 쪽에도 ‘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.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종료해 달라’고 했다”고 말했다. 그는 지난해 7월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립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.
감찰의 ‘표적’들에 대한 징계는 두 감사담당관이 모두 좌천된 뒤 마무리됐다. 지난해 7월 문체부는 김종덕 당시 장관의 결재를 받아 서 사무관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. 이 주무관에게는 견책조치가 결정됐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“민정수석실·특감반과 문체부의 관계는 갑을 관계였다. 문체부는 장관마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”고 말했다.
김선미·송승환 기자 song.seunghwan@joongang.co.kr
“너무 억울해 ‘자살이라도 할까’ 하고 두 번쯤 생각했습니다. 우병우와 특별감찰반은 내 주장이 먹히지 않는 절대권력이었으니까요. 내가 죽어야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”
백모(57)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은 ‘우병우’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였다. 아직도 상처가 깊은 듯했다.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그를 만났다. 여러 차례의 설득 끝에 성사된 자리였다.
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그는 “서모 사무관 등 2명을 징계하라”는 우병우(50)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(이하 특감반)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지난해 2월 지역발전위원회 지역문화과장으로 좌천된 뒤 지난 2월 감봉 등 추가 징계를 받았다. 1990년 7급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그는 “부끄럽지 않은 공무원이 되려 지난 27년간 ‘공정’과 ‘투명’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다”고 말했다.
그가 좌천된 표면적 이유는 “민원인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”이라는 민정수석실의 지적 때문이었다. 하지만 그는 “문화계 30년 멘토와 휴일에 골프를 친 것과 한 공연업체가 관행적으로 홍보를 위해 보낸 무료 초대권이 발견된 게 문제의 전부”라고 주장했다. 지난 2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한 상태다.
2015년 11월 처음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에 불려 간 백 전 감사담당관은 특감반 이모 과장에게 “국민소통실 소속 서모 사무관과 이모 주무관을 무조건 징계하라. 윗분의 지시다”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. 백 전 감사담당관은 “자체 감찰 TF팀을 꾸려 조사했지만 징계 사유를 찾을 수 없었고 그대로 보고한 게 화근이 됐다”고 설명했다. 지난해 1월 특감반은 그의 사무실에 들이닥쳤다. 백 전 감사담당관은 “영장도 없이 저와 사무관, 주무관의 휴대전화·컴퓨터·서랍·e메일을 4시간 이상 뒤졌다”고 말했다. 3일 뒤 특감반에 불려 간 그는 “지시에 따라 신발과 양말을 벗었고 이후 신체 수색을 당했다. 휴대전화도 빼앗긴 뒤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라고 강요받았다. 지갑에서 국가유공자증이 나오자 ‘사기 쳐 받은 것 아니냐. 털어 보겠다’는 협박도 받았다”고 했다. 82년 군 복무 시절 지뢰를 밟고 파편에 다쳐 받은 유공자증이었다.
백 전 감사담당관이 좌천된 이후에도 특감반의 감찰 요구는 후임자인 김모(58) 전 감사담당관을 상대로 계속됐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모두 다섯 번에 걸쳐 특감반 사무실에 불려 갔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“호통을 치는 건 기본이고 ‘가족들은 편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니냐’ ‘통장을 다 뒤지겠다’며 가족들을 뒷조사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다. 나에겐 협박으로 다가왔다”고 말했다. 휴대전화를 빼앗은 특감반원에게서는 “누구랑 이렇게 통화를 한 거야” “무슨 얘기를 했어” 등의 추궁이 이어졌다고 한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“업무랑 무관한 것들도 다 소명할 수밖에 없었다. 항의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”고 덧붙였다.
지난달 특검팀이 작성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청구서에는 김 전 감사담당관이 “서 사무관에게는 징계 사유가 없다”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를 특감반에 전달하자 특감반이 수차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며 “무조건 중징계하겠다는 보고서를 쓰라”고 압박한 정황이 담겨 있다.
둘 다 좌천된 뒤 표적감찰 대상자 결국 징계
김 전 감사담당관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‘셀프 좌천’뿐이었다고 한다. 그는 “민정 쪽에도 ‘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. 이 사건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고 종료해 달라’고 했다”고 말했다. 그는 지난해 7월 문체부 산하기관인 국립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.
감찰의 ‘표적’들에 대한 징계는 두 감사담당관이 모두 좌천된 뒤 마무리됐다. 지난해 7월 문체부는 김종덕 당시 장관의 결재를 받아 서 사무관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. 이 주무관에게는 견책조치가 결정됐다. 김 전 감사담당관은 “민정수석실·특감반과 문체부의 관계는 갑을 관계였다. 문체부는 장관마저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”고 말했다.
김선미·송승환 기자 song.seunghwan@joongang.co.kr
- [닉네임] : 카리아리[레벨] :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 정치/사회 목록
정치/사회 목록